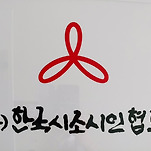<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b><span style="color: #1a5490;">비</span></b><span style="color: #1a5490;"><span data-ke-size="size18">&#160;외 7편</span></span></span></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이우걸</span></span></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나는 그대 이름을 새라고 적지 않는다</span></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나는 그대 이름을 별이라고 적지 않는다</span></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깊숙이 닿는 여운을</span></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마침표로 지워 버리며.</span></span></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새는 날아서 하늘에 닿을 수 있고</span></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무성한 별들은 어둠 속에 빛날 테지만</span></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실로폰 소리를 내는</span></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가을날의 기인 편지.</span></span></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b><span style="color: #1a5490;">팽이</span></b></span></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쳐라, 가혹한 매여 무지개가 보일 때까지</span></span></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나는 꼿꼿이 서서 너를 증언하리라</span></span></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무수한 고통을 건너</span></span></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피어나는 접시꽃 하나.</span></span></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b><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span style="color: #1a5490;">비누</span></span></b></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이 비누를 마지막 쓰고 김 씨는 오늘 죽었다</span></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헐벗은 노동의 하늘을 보살피던</span></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영혼의 거울과 같은</span></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조그마한 비누 하나.</span></span></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도시는 원인모를 후두염에 걸려 있고</span></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김 씨는 쫓기며 걷던 자산동 언덕길 위엔</span></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쓰다 둔 그 비누만 한</span></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달이 하나 떠 있다.</span></span></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b><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span style="color: #1a5490;">모란</span></span></b></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피면 지리라</span></span></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지면 잊으리라</span></span></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눈 감고 길어 올리는 그대 만장 그리움의 강</span></span></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져서도 잊혀지지 않는</span></span></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내 영혼의</span></span></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자줏빛 상처.</span></span></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b><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span style="color: #1a5490;">소금</span></span></b></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불면의 시대를 각으로 떠서 우는</span></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부패한 시대를 모로 막아 우는</span></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짜디짠 너의 이름을 소금이라 부르자.</span></span></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마침내 굴욕뿐인 이승의 현관 앞에서</span></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네가 걸어와야 했던 유혈의 가시밭길</span></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이고 진 번뇌의 하늘 그 또한 얼마였으리.</span></span></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이제는 지나간 역사의 창이라지만</span></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어느 누가 염치없이 네 이름을 훔치려 하나</span></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소금은 말하지 않아도 제 분량의 영혼이 있다.</span></span></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b><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span style="color: #1a5490;">이름</span></span></b></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자주 먼지 털고 소중히 닦아서</span></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가슴에 달고 있다가 저승 올 때 가져오라고</span></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어머닌 눈 감으시며 그렇게 당부하셨다.</span></span></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가끔 이름을 보면 어머니를 생각한다</span></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먼지 묻은 이름을 보면 어머니 생각이 난다</span></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새벽에 혼자 일어나 내 이름을 써 보곤 한다.</span></span></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티끌처럼 가벼운 한 생을 상징하는</span></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상처 많은, 때 묻은, 이름의 비애여</span></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천지에 너는 걸려서 거울처럼 나를 비춘다.</span></span></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b><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span style="color: #1a5490;">안경</span></span></b></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껴도 희미하고 안 껴도 희미하다</span></span></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초점이 너무 많아</span></span></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초점잡기 어려운 세상</span></span></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차라리 눈감고 보면</span></span></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더 선명한</span></span></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얼굴이 있다.</span></span></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b><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span style="color: #1a5490;">카페 피렌체에서</span></span></b></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당신이 베니스에 가 있는 동안에도</span></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카페 피렌체에서 나는 차를 마신다</span></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밤 열시 문이 닫히고 귀가하는 그 시각까지</span></span></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벽에는 두오모 대성당이 걸려 있고</span></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사람들은 기도처럼 하루를 속삭이지만</span></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그곳에 홀로 앉아서 나는 차를 마신다</span></span></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바닷물은 없지만 곤돌라는 없지만</span></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인생이란 노를 젓는 뱃사공의 하루 같은 것</span></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당신이 베니스에 있는 동안</span></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나는 나를 마신다</span></span></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160;</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 이우걸 자선 75편 대표시조 선집『비누』 2024. 창연출판사</span></span></p>
<!-- -->
카페 게시글
시조
비 외 7편 / 이우걸
김덕남
추천 0
조회 82
24.10.01 06:31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