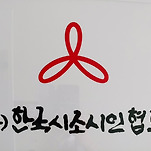<p class="0"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lt;</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신웅순의 시조 이야기 </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1&gt;</span></p>
<p class="0"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nbsp;</p>
<p class="0"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text-align: center;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font-size: 20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김옥중의 </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2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font-size: 20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홍매화 그늘 아래에서</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2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span></p>
<p class="0"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text-align: center;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nbsp;</p>
<p class="0"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text-align: center;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nbsp;</p>
<p class="0"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text-align: center;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nbsp;</p>
<p class="0"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text-align: center;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석야 신웅순</span></p>
<p class="0"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nbsp;</p>
<p class="0"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nbsp;</p>
<p class="0"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매화가 지고 있다</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뒷모습이 보고 싶어 개나리</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산수유</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목련</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진달래꽃들이 제멋대로 핀다</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조금 있으면 연둣빛 잎새들이 꽃그늘을 가려줄 것이다</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봄은 꽃 때문에 환하고 잎새 때문에 따뜻하다</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p>
<p class="0"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얼마 전 시인으로부터 시집 한 권 부쳐왔다</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마디마디 아름다운 절규였다</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시인의 시조집을 읽고 싶었는데 이제야 소원을 풀었다</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span></p>
<p class="0"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쉽게 써서 좋았고 깊이가 있어 좋았다</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p>
<p class="0"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nbsp;</p>
<p class="0"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그 누가 나를 보고 꽃 한 폭을 치시라면</span></p>
<p class="0"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nbsp;</p>
<p class="0"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선지보다 더 하얀 바람 한 필 끊어다가</span></p>
<p class="0"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nbsp;</p>
<p class="0"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저 핏빛</span></p>
<p class="0"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내 가슴을 적시는 </span></p>
<p class="0"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nbsp;</p>
<p class="0"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당신만을 치리라</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span></p>
<p class="0"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김옥중의 </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홍매화 그늘 아래서</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전문</span></p>
<p class="0"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p>
<p class="0"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xml:namespace prefix = v /--><v:shapetype id="_x0000_t75" coordsize="21600,21600" o:spt="75" o:preferrelative="t" path="m@4@5l@4@11@9@11@9@5xe" filled="f" stroked="f"><v:stroke joinstyle="miter"></v:stroke><v:formulas><v:f eqn="if lineDrawn pixelLineWidth 0"></v:f><v:f eqn="sum @0 1 0"></v:f><v:f eqn="sum 0 0 @1"></v:f><v:f eqn="prod @2 1 2"></v:f><v:f eqn="prod @3 21600 pixelWidth"></v:f><v:f eqn="prod @3 21600 pixelHeight"></v:f><v:f eqn="sum @0 0 1"></v:f><v:f eqn="prod @6 1 2"></v:f><v:f eqn="prod @7 21600 pixelWidth"></v:f><v:f eqn="sum @8 21600 0"></v:f><v:f eqn="prod @7 21600 pixelHeight"></v:f><v:f eqn="sum @10 21600 0"></v:f></v:formulas><v:path o:extrusionok="f" gradientshapeok="t" o:connecttype="rect"></v:path><!--?xml:namespace prefix = o /--><o:lock v:ext="edit" aspectratio="t"></o:lock></v:shapetype><v:shape id="_x178762080" style="width: 425.2pt; height: 204.14pt; v-text-anchor: top;" type="#_x0000_t75"><v:imagedata o:title="EMB00001a1c663b" src="file:///C:\Users\SEC\AppData\Local\Temp\Hnc\BinData\EMB00001a1c663b.jpg"></v:imagedata><!--?xml:namespace prefix = w /--><w:wrap type="topAndBottom"></w:wrap></v:shape>&nbsp;&nbsp;</p>
<p class="0"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text-align: center;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4721337557ED14E03" class="txc-image" width="1024"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홍매화그늘아래서(흘림)[1].jpg" exif="{}" actualwidth="1024" id="A_24721337557ED14E035C3D"/></p>
<p class="0"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김옥중시조 '홍매화그늘아래서' 석야 서.&nbsp; </p>
<p class="0"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nbsp;</p>
<p class="0"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시조는 많은 돌이 필요없다</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12</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개의 돌로 일상의 말이면 된다</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어디에 두어야하느냐</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반드시 맥점이어야한다</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녹록치가 않은 것이 위치이다</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p>
<p class="0"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인간 세상에 그리움이 없다면 어쩔뻔 했을 것인가</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그 누가 나를 보고 꽃 한 폭 치시라면 선지보다도 더 하얀 바람 한 필 끊어다가 저 핏빛 내 가슴을 적시는 당신만을 치리라</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는 이 열두마디 울음이 우리 가슴을 핏빛으로 물들이고 있다</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영원한 명화 한폭이다</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이를 신품이라고 한다</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p>
<p class="0"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시조는 담묵의 정도가 맞아야 하고 채도와 명도가 어울려야한다</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이런 아정한 화음을 또 어디서 들을 수 있을 것인가</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span></p>
<p class="0"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시인은 </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2012</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년 정소파 시조시인 </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100</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세 기념 문학 좌담에 참석한 일이 있었다</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광주고 문학관 언덕길에는 한 그루 홍매화가 있다</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시인은 흐드러지게 핀 그 홍매화의 전율</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한다</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p>
<p class="0"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span></p>
<p class="0"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nbsp;</p>
<p class="0"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font-size: 9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홍매화를 봤지만 이처럼 운치 있는 홍매화는 처음이었습니다</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9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font-size: 9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문학 좌담이 끝나고 돌아오 는 길에 다시 들려 홍매화를 바라보니 더더욱 장관이었습니다</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p>
<p class="0"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nbsp;</p>
<p class="0"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시인에게는 이 홍매화가 첫경험이다</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이것이 </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홍매화 그늘 아래서</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시조를 쓰게 했다</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작품 하나가 탄생하기까지는 누구나 계기가 있기 마련이다</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누군가가 그랬다</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시인은 죽을 때까지 설레이는 가슴을 졸업하지 않는 사람이라고</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span></p>
<p class="0"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시인은 </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1979</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년 전남매일신문 신춘문예 시조에 당선했으며 </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1980</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년 </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시조문학</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으로 등단했다</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작품은 우아하고 단아하다</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목소리는 명주빛</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여창 가곡을 듣는 듯하다</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가까운 산새소리 같고 천길 물소리 같다</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p>
<p class="0"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nbsp;</p>
<p class="0"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바위에 새긴 고전 </span></p>
<p class="0"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층층이 쌓였구나</span></p>
<p class="0"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nbsp;</p>
<p class="0"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한 권쯤 슬쩍 뽑아</span></p>
<p class="0"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달빛에 읽어 보면</span></p>
<p class="0"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nbsp;</p>
<p class="0"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구운몽</span></p>
<p class="0"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팔선녀들이 </span></p>
<p class="0"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까르르 나오실까</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p>
<p class="0"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김옥중의 </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채석강 단애</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span></p>
<p class="0"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nbsp;</p>
<p class="0"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층층히 쌓인 책을 슬쩍 한 권 뽑아 달빛에 읽어보다니</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거기에서 고전의 백미</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구운몽 팔선녀들이 까르르 웃으며 나오다니</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선녀들이 춤이라도 출 것 같다</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화관무 같은 춤일 것이다</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p>
<p class="0"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시조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는 없다</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시조의 멋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p>
<p class="0"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연구실에 어둠이 내린다</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산새 소리가 멀리서 들려온다</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집을 찾는 아기새의 울음 소리이다</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새울음도 오늘은 한편의 시조이다</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시인이 내게 행복을 주었으니 이보다 더 기쁜 날은 없다</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p>
<p class="0"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p>
<p class="0"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nbsp;&nbsp; - 시조문학, 2015. 여름호,118-120쪽.&nbsp;</p>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div>
<p class="0"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nbsp;</p>
<p class="0"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nbsp;</p>
<!-- -->
카페 게시글
수상작품
신웅순의 시조한담1 -김옥중 편
신웅순
추천 0
조회 128
15.06.15 22:22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