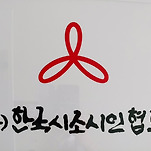<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04sK/7524c4581cc2e1b21b5d55b0438c46da7a6bacb3"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04sK/7524c4581cc2e1b21b5d55b0438c46da7a6bacb3" data-origin-width="3067" data-origin-height="2550"></div><p>&#160;</p><p><span data-ke-size="size20">&#160; &#160;묵묵옹 자서</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160; &#160;하늘이 무슨 말을 하시는가.&quot; 땅인들 무슨 말을 하시겠는가.&quot; 하늘과 땅 모두 아무런 말이 없었다. 해에게 물어도 응하지 않고, 달에 게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다. 해와 달이 다 말이 없고, 산에서 노래하니 산이 노래하지 않고, 물에서 읊으니 물도 읊지 않누나. 어찌하여 산은 말이 없고, 어찌하여 물도 말이 없는가. 꽃은 웃어도 그 소리 들리지 않고, 새가 지저귀어도 그 소리 못 알아들으니, 어찌하여 꽃은 말이 없고 어찌하여 새도 말이 없는가.</span></p><p><span data-ke-size="size18">&#160; &#160;어허! 껄껄 웃어 보네. 하늘은 만물을 덮어 주고 땅은 만물을 실어 주어 내 한 몸으로 본받으니 나 어찌하여 잠자코 침묵하지 않는가. 해와 달이 내리비치고 내 한 몸으로 본받으니, 나 어찌하여 잠자코 침묵하지 않는가. 내가 바로 이 강산의 주인인데 강산이 말이 없으니, 곧 내가 말이 없고, 그러한즉 내가 말이 없는가.</span></p><p><span data-ke-size="size18">&#160; &#160;하늘과 땅이 말이 없음에서 얻었으니, 해와 달이 말이 없음에서 얻</span><span data-ke-size="size18">고 산과 물이 말이 없음에서 다하고, 꽃과 새가 말이 없음에서 다하는구나. 한 번 움직이면 한 번 고요하고 한 번 말하면 한 번 침묵하 니 어찌 침묵하지 못하면서 나오려 하지 않는가. 왜 그러한가. 내 천성이 그런 때문이요, 내 마음이 그런 때문이다. 지극히 은미(隱微) 하여 볼 수 있는 형체가 없고, 지극히 정묘(精妙)하여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없으면 이것은 천성이 껄껄 웃고, 마음이 껄껄 웃는 것이 아닌가.</span></p><p><span data-ke-size="size18">&#160; &#160;내가 질박하고, 내가 재주가 무디어서 옥돌을 다듬어도 보배로운 그릇을 이루지 못하고, 납을 갈아도 칼이 이루어지지 못하니 날카로운 칼날인즉 이것은 바탕이 말이 없고, 재주가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禮)를 행함에서도 말이 없다. 어디에 쓰겠는가. 구슬과 비단이 이리저리 뒤섞여 엇갈려 즐거움에도 말이 없고, 무엇을 번거롭게 하겠는가. 종과 북이 거문고 타는 소리와 금옥이 부딪는 소리로 말을 교묘하게 꾸민 다음에야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나는 뱀처럼 천박하게 말하는 것이 없으니 아첨하는 말을 해도 말이 없고, 그 얼굴빛을 아름답게 한 뒤에야 해를 면할 수 있지만, 나는 송옥(宋玉)의 아름다운 모습이 없으니 말이 없을 뿐이네.</span></p><p><span data-ke-size="size18">&#160; &#160;시에서 말이 없으므로 시를 이루어도 귀신이 울지 않고, 산문[筆] 에서 말이 없으므로 산문이 뒤떨어져서 비바람에도 놀라지 않았다. 또 대저 희황( <span style="color: #333333;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羲</span>皇/羲王)이 들창문 아래에서 줄 없는 거문고를 퉁기는데, 거문고 또한 잠잠하다. 어떤 도인(道人)이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구멍 없는 피리를 부니 피리(笛) 또한 잠잠하고, 한 마을 좁은 길 에서의 이미 수레와 우마의 덜커덩거리는 소리가 없으니 이 또한 나의 혀가 가만있네.</span></p><p><span data-ke-size="size18">&#160; &#160;깁고 기워[百結] 해진 누더기 옷차림[<span style="color: #333333;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40329;衣</span>]으로 사치스럽지 않으</span><span data-ke-size="size18">며, 패옥의 찰랑거리는 소리 또한 내 눈이 말이 없고 한단지몽(<span style="color: #333333;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邯鄲之夢</span>)을 얻었으니 얼마나 즐거우랴. 새옹지마(塞翁之馬)처럼 말을 잃어도 무엇을 원망하여 내 이미 공명에는 얻거나 잃음의 마당에는 할 말이 없노라. 두루미 다리가 길다고 잘라내면 무슨 이익이 있을 것이며, 오리 다리가 짧다고 달아낸들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내 이미 길고 짧음의 형편에 말할 것이 없노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160; &#160;달이 대창살문[筠窓]에 비치어 베개 높이고서 누워 졸고 있으니 졸음이 묵묵하고 늦은 봄날에 술 찌꺼기 언덕(槽丘) 술잔을 들어 몹시 취하니 술에 취해도 말이 없고, 호수에서 물고기를 보니 물고기는 나의 즐거움을 모르고 나도 물고기의 즐거움을 모르지만, 물고기와 나는 다 같이 말이 없으니, 밑바닥 물고기나 다름없네. 하늘 밖 솔개를 보니 솔개는 나의 즐거움을 모르고 나도 솔개의 즐거움을 모르지만, 솔개와 나는 다 같이 말이 없으니, 날짐승이나 다름없네. 해오라기는 날마다 멱 감지 않아도 희고, 까마귀는 날마다 물들이지 않아도 검으니 희다느니 검다느니 해본들 이미 크게 귀찮아할 것 도 없네. 이야말로 말할 것이 없어 더 따져 가릴 것도 없다.</span></p><p><span data-ke-size="size18">&#160; &#160;갑은 이미 옳다고 했으나 을은 이미 아니라 했으니, 옳다느니 그르다느니 하는 말에서 그르다고 하는 말도 할 말이 많아 이야말로 말할 것이 없어 더 따져 해명할 것도 없다. 내 한 몸을 보더라도 어째서 &#39;묵묵(<span style="color: #333333;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默默)</span> &#39;이 이처럼 많단 말인가? 묵묵에서 나고, 묵묵에서 자라고, 묵묵에서 늙어가니, 외롭고 쓸쓸한 나의 옛 모습은 할 말이 없어 앉아 있고, 버쩍 야위어서 피골이 상접[鳴骨]하여 할 말이 없어도[默<span style="color: #333333;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默</span>而] 행하니, 한집안 사람들이 묵묵옹(默<span style="color: #333333;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默</span>翁)이라 일컬어&#160;</span><span data-ke-size="size18">한동네 사람들도 묵묵옹으로 부른다. 물에서 낚시하니, 묵묵어옹(<span style="color: #333333;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默</span><span style="color: #333333;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默漁翁)이라 부르고 <span style="color: #333333;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산에서 나무를 하니 묵묵초옹(默默樵翁)이라&#160;</span></span></span><span data-ke-size="size18">부른다. 묵묵이 천지자연(乾坤)이고, 가는 곳마다 묵묵이 아닌 것이 없기에 나의 자호(自號)는 묵묵옹(默默翁)이다. 오호라! 묵묵의 뜻이&#160;</span><span data-ke-size="size18">어찌 어지러운 바가 없겠는가.</span></p><p><span data-ke-size="size18">&#160; &#160;행단(杏壇)에서 봄바람에 홀로 앉아 거문고를 타는 이니 곧 공자가 묵묵이고, 누추한 시골에서 검소하게 살면서도 깊게 사귀는 일을 좌망(坐忘)하니, 곧 안회(安回: 顔賢)가 묵묵하고, 하남(河南)이 묵묵하고, 흙인형[泥塑] 앞에 앉아 주렴계(周濂溪)가 묵묵하니, 마음은 태극에 침잠한다. 그러하니 성현(聖賢)이 묵묵하고, 대대로 이어 전하는 것은 그 묵묵함의 열매를 얻음이라.</span></p><p><span data-ke-size="size18">&#160; &#160;이제 내가 호를 묵묵(默默)으로 한 것은 이를테면 그 묵묵을 이름 으로 한 것이지만, 이름이란 실제에 대해서는 손님이라고 한 때문이 니 어찌 공자와 안연[孔顔]의 묵묵과 정주(程周)의 묵묵을 얻었는가. 오호라! 지극한 말소리[至音]는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고) 대악(大樂)이니, 내가 이른바 묵묵이 곧 지극한 말소리의 묵묵임을 알지 못하겠는가. 그렇지만 대악이 묵묵한가. 동상[金人]에는 입이 꿰매져[緘口] 있고, 벙어리 종[啞鍾]이 울리지 않으니, 내가 이른바 묵묵이고, 곧 동상(金人)이 묵묵이니, 그렇지만 벙어리 종이 묵묵이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말은 반드시 음률에 맞아야 하고, 행동은 반드시 법도에 맞아야 하니 진정 언행에는 묵묵이 아니로다. </span></p><p><span data-ke-size="size18">&#160; &#160;어버이를 섬김에는 효도를 다하고, 어른을 섬김에는 공경을 다하므로, 효도와 우애에는 묵묵이 아니로다. 아내와 자식이 있는 곳에 머무르니, 금슬이 좋고, 형제가 있는 곳에 머무르니, 형은 질나발[塤]</span><span data-ke-size="size18">을 불고, 아우는 피리[&#31722;]를 불어 서로가 화목하여 그것이 이른바 묵묵이로다. 고금을 통하여 옛날 책의 글을 평하고 대대로 내려온 인물을 논평하건대 아무개야말로 어질고, 아무개야말로 슬기롭네. 내가 권하는 바는 아무개야말로 어리석고, 아무개야말로 어리석으니, 내가 경계하는 것은 바로 곧 그 묵묵이라 말할 수 있다. 때로는 묵묵하여 묵묵하고 때로는 묵묵하지 않아 묵묵이 아니다. 다만 묵묵하지 않은 것이 묵묵하겠으며, 묵묵한 것이 묵묵하지 않겠는가. </span></p><p><span data-ke-size="size18">&#160; &#160;오호라! 조금이나마 조용히 있고자 하니,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하겠는가.</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20">默默翁 自序</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160; 天何言哉 地何言哉 天地皆默默 問日而不應 問月而不答 日月皆默默 歌於山而山不歌 詠於水而水不詠 山何默默 水何默默 花笑而不聞其聲 鳥啼而不辨其音 花何默默 鳥何默默 嗚呼&#22079;&#22079; 天地覆載 我一身則 我何不默默乎日月照臨 我一身則 我何不默默乎 吾便是江山之主人 則江山之默默 卽吾之默默 然則吾之默默 得於天地之默默 得於日 月之默默 兼於山水之默默 兼於花鳥之默默 一動一靜一語一&#40665; 何莫 非默默中出來耶 何者 吾之天性也 吾之心理也 至隱至微 無形色之可見 至精至妙 無聲音之可聞 則此非性之&#22079;&#22079; 心之&#22079;&#22079;者耶 吾之質朴矣 吾之才鈍矣 琢玉石而不成寶器 磨鉛刀而不作 利鋒則此非質之默默 才之默默者也 於禮也默默 何用乎 玉帛之交錯 於樂也默默 何煩乎 鍾鼓之&#37847;&#37848; 巧其言然後 可以容世 而我無祝蛇之 &#20318;言而默默 令其色然後 可以免害 而我無宋玉之美貌而默默 默默於詩故詩成而鬼神不</span><span data-ke-size="size18">泣 默默於筆 故筆落而風雨不驚 且夫羲皇密下彈無絃之琴 琴亦默默&#160;</span><span data-ke-size="size18">道入席上 吹無孔之笛 笛亦默默 一巷圭華已無車馬喧&#38352; 是亦吾舌之默默 百結&#40329;衣不多 佩玉之&#29830;&#37848; 是亦吾眼之默默 邯鄲之夢 得之何喜 塞翁之馬 失之何&#24909; 吾已默默於得失之場也 鶴脛之長 斷之何益 鳧脛之短 續之何補 吾已默默於長短之地也 月照筠窓 枕高而臥睡 睡之 默默 春&#26202;槽丘 引白而大醉 醉之默默 湖上觀魚 魚不知我之樂 而我不 知魚之樂 魚與我 俱是默默 底物也 天外觀鳶 鳶不知我之樂 而我不知 鳶之樂 鳶與我 俱是默默 底物也 鷺不日浴而白 鳥不染而黑 則日白 日黑 無己太煩乎 可以默默而不辨也 甲者&#26082;是 乙者&#26082;非 則日是非 非亦多事乎 可以默默而不論也 觀我一身 是何默默之多也生於默默 長於默默 老於默默 蕭然古貌默默而坐 &#30319;然鳴骨默默而行 同室之人 稱之以默默翁 同里之人 稱之以默默翁 釣於水則稱之以默默漁翁 採於山則稱之以默默樵翁 默默乾坤 無往而不&#28858;默默故 余自號默默翁 噫 默默之意 豈無所擾乎 杏壇春風 獨坐&#30391;瑟者 卽孔聖之默默 陋巷簞瓢 深契坐忘者 卽&#38991;賢之默默 河南之默默 坐於泥塑 濂溪之默默 心潛太極 然則聖賢之默默 相傳者 得其默默之實也 今吾之默默 &#28858;號者 假其默默之名也 名者 實之賓也 安敢得孔&#38991;之默默 程周之默默 嗚呼 至音無聲 大樂 不知 吾所謂默默 卽至音之默默歟 抑亦大樂之默默歟 金人 緘口啞鍾 不鳴 吾所謂默默 卽金人之默默 抑亦啞鍾之默默歟 雖然 言必中律 行必中規 不默默於言行也 事親焉 盡孝 事長焉盡敬不默 默於孝悌也 處於妻子而琴瑟相&#30391; 處於兄弟 塤&#31722;相和 其可謂默默乎 評古今於黃卷之上 論人物於歷代之中 日某也賢 某也智 吾所勸也 日 某也愚 某也不肖 吾所戒也 則其可謂默默乎 時乎默默而默默 時乎不 默默而不默默 則不默默者默默歟 默默者不默默歟 嗚呼 微&#40665; 吾何居 焉</span></p><p>&#160;</p><p><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옮긴이의 말</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20"><span style="color: #111111;">3</span><span style="color: #111111;">대에 걸친 오랜 작업으로 펴내는</span></span></p><p><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20">할아버지의 문집</span></p><p>&#160;</p><p><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전략</span></p><p>&#160;</p><p><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160; &#160;푸른 산의 봄은 알리지 않고 와도 알겠고 </span></p><p><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160; &#160;동쪽 이웃 노인들은 해 저무는 걸 절로 아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p><p><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160; &#160;고요하게 어둠 내리니 사립문을 닫고 </span></p><p><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160; &#160;두견새 소리 들으며 새벽부터 절구에 쌀을 찧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p><p><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160; &#160;며느리 나가서 아이 부르고 또 부르니 </span></p><p><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160; &#160;초당에서 일하는 아이 게으르게 일어나는구나</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p><p><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160; &#160;빗질하는 흰머리에 비스듬히 햇빛 두르고 </span></p><p><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160; &#160;울지 말라며 손자 달래는 손으로 장미를 꺾어주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p><p><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160; &#160;해당화 가지 헤아리니 막걸리가 석 잔이라 </span></p><p><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160; &#160;술 마신 뒤 주방에 저녁밥을 재촉하는구나</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p><p><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160; &#160;천천히 식사하던 사람들이 늦복이 많다고 하니 </span></p><p><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160; &#160;월나라 범려도 부럽지 않은 큰 부자일세</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p><p><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복노인을 기리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頌福老</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송복로</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전문 </span></p><p>&#160;</p><p><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160; &#160;글이 길어졌지만</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마지막으로 한 편만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할아버지께서는 글쓴이에 관한 시를 한 편 남겼습니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바로</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복노인을 기리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頌福老</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송복로</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입니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대일항쟁기</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굴곡진 삶을 살아오신 할아버지께서 만년에 쓰신 작품으로 보입니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우리 집에는 광복 전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1944)</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에 누님이 태어나고</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세월이 한참 지난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6</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년 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1950)</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에 제가 태어났습니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저는 할아버지께서 기다리던 집안의 장손이었습니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생전에 어머니께서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quot;</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니가 아니시모</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나는 이 집에서 몬 살아시끼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quot;</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라는 말씀을 자주 하신 것으로 봐서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이 시는 할아버지의 손자 사랑이 배어 있는 작품이어서 저의 감성을 촉촉하게 적셔줍니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광복 공간의 우리나라는 격동기의 혼란 속에서도 서민들은 평화로운 삶을 구가했던 것 같습니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39;</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푸른 산의 봄은 소리 없이 와도 알겠고</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39;, &#39;</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동쪽 이웃 노인들은 해 저무는 걸</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39;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39;</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고요하게 어둠 내리니 사립문을 닫고</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두견새 소리 들으며 새벽부터 절구에 쌀을 찧으니 한껏 여유로운 풍경입니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39;</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며느리</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39;</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가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39;</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일하는 아이</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39;</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를 부르니 짐짓 게으르게 일어납니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그새 귀한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39;</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손자</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39;</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가 울음을 터뜨린 것 같습니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할아버지는 우렁차게 우는 손자를 달래기 위해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39;</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장미</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39;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한 송이를 꺾어서 어르다가 기꺼운 마음으로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39;</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해당화 가지</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39;</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를 헤아리면서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39;</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막걸리</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39;</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를 드신 것 같습니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자리를 함께하여 식사하던 사람들이 늦복이 많다고</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39;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찬사를 하였습니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마지막 구에서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39;</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월나라</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39;</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의 재상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39;</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범려도 부럽지 않은 큰 부자</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39;</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라고 읊었으니</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만년의 삶을 유유자적 지내셨던 것 같습니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그런 할아버지께서 제가 태어난 지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100</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여일 즈음 별세하셨으니</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저의 애통함은 가슴에 사무칠 수밖에 없습니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p><p>&#160;</p><p><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160; &#160;할아버지께서 남긴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360</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편의 시를 읽고 또 읽어보지만</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그 큰 뜻을 헤아리기에는 제 능력의 한계를 다시금 절감합니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그러나 한편으로 부족하지만</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숙원이었던 할아버지 문집을 제가 매조지게 되어 다행스럽기도 합니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p><p><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160; &#160;이즈음 계묘년</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2023)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납월</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臘月</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에 저는 참으로 신묘한 꿈을 꾸었습니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커다란 각목으로 한글 자모음</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子母音</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문장을 만들고</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그 사이사이에 사과로 쉼표와 마침표를 찍는 꿈이었습니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한글 자모음 각목으로 글자를 새기고 사과로 마침표를 찍는 꿈은 생전 처음이어서 보름여 일 후에 유산</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山</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quot;</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꿈속의 자모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子母</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는 삼대</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三代</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의 이심전심</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以心傳心</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이고</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꿈속의 사과는 손자가 역시</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譯詩</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했음을 아뢰는 헌사</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獻辭</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이니</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정성이 하늘에 닿은 길몽</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吉夢</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이라며</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시역 원고</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詩譯原稿</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를 들고 문묘</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問墓</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하라는 선몽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先夢</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이기도 하고</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출판하기 전에 시역 원고를 조선</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祖先</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께 아뢰라 는 선</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善夢</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quot;</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이라고 해몽하면서 격려해 주셨습니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이제 편집한 원고를 안고 선조이신 탁영 선생의 위패를 모신 자계서원과 청계서원</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묵묵옹 할아버지와 아버지 산소에 예를 갖추어 고유하고</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출판사에 넘기려고 합니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p><p><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160; &#160;이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자람과 오류가 있다면 그것은 모두 불민한 저에게 있습니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아둔한 손자가 한 일이라 할아버지께서도 혜량</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惠諒</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하여 주시리라 믿으면서 이 오랜 작업을 끝내려고 합니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제현의 따뜻한 사랑과 질정을 기대합니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p><p>&#160;</p><p style="text-align: right;"><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계묘년</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2023)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납월 </span></p><p style="text-align: right;"><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불효손 복근</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卜根</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 </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삼가 올립니다</span><span style="color: #111111;" data-ke-size="size18">.</span></p><p>&#160;</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04sK/228d065bbdc2366307dd11f4fd65dcdae6f18b82"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04sK/228d065bbdc2366307dd11f4fd65dcdae6f18b82" data-origin-width="2942" data-origin-height="2550"></div>
<!-- -->
카페 게시글
회원신간
김기호 시 김복근 옮김 『묵묵옹집』 2024. 4. 25. 도서출판 경남
김덕남
추천 0
조회 55
24.11.20 09:08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