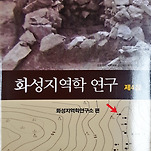<p><span class="txt_sub url">&nbsp;&nbsp;&nbsp;&nbsp;&nbsp;&nbsp;
<xscript type="text/javascript">
//<![CDATA[ var copyUrlButton = { swfurl: 'http://cafecj.daum-img.net/flash/', params: { wmode: 'transparent', allowscriptaccess: 'always', base: 'http://cafecj.daum-img.net/flash/' }, flashvars: { url: 'http://cafe.daum.net/name0900/baO6/37', urlName: '글' }, attributes: { id: 'copyUrlButtonSwf', name: 'copyUrlButtonSwf', 'class': 'op', style: 'vertical-align: middle;', xxonmouseover: 'this.className=""', xxonmouseout: 'this.className="op"' } } swfobject.embedSWF(copyUrlButton.swfurl + 'copyClipboard.swf?v=1', 'copyUrlButton', '22', '13', '9.0.124', false, copyUrlButton.flashvars, copyUrlButton.params, copyUrlButton.attributes); //]]>
</xscript>
&nbsp;&nbsp;&nbsp;&nbsp;&nbsp;&nbsp;&nbsp; </span></p> <p><!-- end article_writer -->
<style type="text/css">.bbs_contents p{margin:0px;}</style>
</p><div class="bbs_contents" id="bbs_contents"><div class="bbs_contents_inbox"><div class="user_contents tx-content-container scroll " id="user_contents" name="user_contents"><table class="protectTable" id="protectTable"><tbody><tr><td><!-- clix_content 이 안에 본문 내용 외에 다른 내용을 절대 넣지 말 것 -->
<xscript type="text/javascript">//<![CDATA[ document.write(removeRestrictTag()); //]]></xscript>
<!--StartFragment--><p class="1"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2.8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font-family: 서울결정B; mso-fareast-font-family: 서울결정B;"><strong><span style="font-size: 18pt;">토박이 이름의 한자식 표기</span></strong></span></p><p class="1"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text-align: center; margin-top: 5.7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서울결정B;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font size="2">- </font></span><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font-family: 서울결정B;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서울결정B;">우리말 토박이 이름을 한자로 억지로라도 적자니 우리식 한자가 필요해 </span>-</p><p class="1"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text-align: center; margin-top: 5.7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br></p><p class="1"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text-align: center; margin-top: 5.7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img width="691" height="406" class="txc-image" id="A_2726F53858E223A51A92FE" style="width: 691px; height: 406px; clear: none; float: none;"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726F53858E223A51A"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160903.jpg" exif="{}" actualwidth="1024" id="A_2726F53858E223A51A92FE"/><br></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br></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요즘 사람더러 우리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돌쇠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한자로 적어 놓으라고 하면 막막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자에 해당하는 한자를 별로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런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우리 조상들은 이를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乭釗&#17307;</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고 적고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돌쇠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으로 읽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石</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뜻에 해당하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石</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음을 나타내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받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乭</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로 적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뜻과 음을 동시에 나타냈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63796;</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자에 한글 자모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ㅁ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모양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口</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입 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를 받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표기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우리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과 한자의 조합인 셈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br></span></p><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img width="576" height="395" class="txc-image" id="A_250C833B58E2244B21A336" style="width: 576px; height: 395px; clear: none; float: none;"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50C833B58E2244B21"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국자 (2).jpg" exif="{}" actualwidth="1024" id="A_250C833B58E2244B21A336"/><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br></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중국의 표음문자인 한자는 우리말을 제대로 나타낼 없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토박이 순 우리말이 많은 우리의 한국어와는 애초부터 좋은 짝이 되지 못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다시 말하면 한자는 우리말을 표기하기엔 완벽하지 못한 글이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특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토박이 땅이름이나 사람이름을 적을 때 이를 적을 마땅한 한자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래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옛날 우리 선비들은 중국에서는 아예 없는 우리식의 한자를 만들어 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주로 한자와 우리 글자로 조합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국식 한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를 만든 것인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러한 식으로 만들어진 글자들은 중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지금도 거의 볼 수 없는 것들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새 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자를 써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ㄹ</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음을 대신한 것이 많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口</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입 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자를 써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ㅁ</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음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글 자모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ㅇ</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자를 써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ㅇ</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소리값 음을 보태기도 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러한 식의 조합은 한글 창제 이후부터 더욱 많아진 것으로 추측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자와 한글의 자모를 짜 맞춘 글자들이 많이 나와 이용된 흔적이 문헌 등을 통해서 많이 발견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중국에서 만들어진 한자는 역시 음의 체계가 다른 우리말을 제대로 표기하기에는 역부족이었기에 이러한 식의 조합 글자들이 적히고 읽힌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br></span></p><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img width="600" height="390" class="txc-image" id="A_2244563458E2240D2BCD50" style="width: 600px; height: 390px; clear: none; float: none;"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244563458E2240D2B"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국자 (3).jpg" exif="{}" actualwidth="1024" id="A_2244563458E2240D2BCD50"/><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br></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우리 조상들은 의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義賊</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으로 알려진 조선시대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임꺽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어떻게 적었을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자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63988;巨正</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고 적기도 했지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임거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으로 읽혀 원이름과 상당한 차이가 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러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꺽</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자에 가까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자를 만들어 적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자에 한글 자모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ㄱ</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자를 밑에 받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2404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자를 만들어 낸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쁜 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란 뜻으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란 이름을 지었다면 이를 한자로 어떻게 적었을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入分</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입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伊分</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으로 적기도 했지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伊</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984836;</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으로 써서 완전한 발음이 되게 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分</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자를 된소리로 만들기 위해 그 글자에 된소리를 의미하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자를 위나 아래쪽에 붙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꾸짖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성을 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뜻이어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된소리로 발음하라는 뜻이었을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참으로 기발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곱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란 이름을 가졌다는 어느 할머니 이름이 호적에는 어떻게 올라라가 있나 했더니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9433;丹</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으로 나와 있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원래의 한자에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자가 없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자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ㅍ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발음에 근사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자를 받침으로 받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9433;</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자를 만든 것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보름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믐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란 이름의 섬이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를 한자로 적어야 하는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적을 만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보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자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자가 없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자라도 있으면 거기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ㅁ</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받쳐서라도 만들면 되었지만 그나마도 없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런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결국 연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延音</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이용해 이를 해결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乶音島</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볼음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今音島</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금음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로 적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보름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그믐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표기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甫</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자에 우리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ㄹ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모양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乙</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을 받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라는 음을 우리식 한자로 만들어 적은 것도 참으로 재미있는 발상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곰달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는 땅이름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고음월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古音月川</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고음달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古音達乃</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라고 표기한 것보다 더 앞선 생각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br></span></p><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br></p><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img width="516" height="375" class="txc-image" id="A_2123D93B58E2266135C507" style="width: 516px; height: 375px; clear: none; float: none;"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123D93B58E2266135"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곰달내.jpg" exif="{}" actualwidth="1024" id="A_2123D93B58E2266135C507"/></p><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br></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br></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바깥 개(浦)</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란 뜻의 땅이름인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밧</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22814;怪</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밧</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로 적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바깥'이란 뜻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外</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외</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자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자를 받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밧</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자를 만들어 낸 것</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밧'은 '바깥'의 옛말이다.</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우리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움막</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의 뜻인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21378;</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굴바위 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에 근사한 음을 가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音</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음</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자를 넣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으로 읽도록 하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막</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자를 붙여 표기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br></span></p><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img width="521" height="361" class="txc-image" id="A_2267763358E220D23D56F3" style="width: 521px; height: 361px; clear: none; float: none;"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267763358E220D23D"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국자 (4).jpg" exif="{}" actualwidth="1024" id="A_2267763358E220D23D56F3"/></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br></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전남 고흥 해안에는 '봇돌바위'리는 바위섬이 나오는데, &lt;대동여지도&gt;에서는 이를 한자로 '&#21944;乭島'로 표기했다. '&#21944;乭'이란 한자 역시 우리식 한자다. '질(叱)'자는 이처럼 받침의 구실도 했다. </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br></span></p><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img width="519" height="324" class="txc-image" id="A_272CC03358E222491D5DF4" style="width: 519px; height: 324px; clear: none; float: none;"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72CC03358E222491D"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봇돌바위.jpg" exif="{}" actualwidth="832" id="A_272CC03358E222491D5DF4"/></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br></span></p><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자로의 표음이 불가능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갓</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것</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놈</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늣</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늦</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얍</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등의 글자도 한자와 우리 한글의 자모를 짜맞추어 완벽하게 만들어 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일부 한자의 불가능한 표음 기능을 받쳐 주기까지 하면서 어느 음이나 표현을 가능하게 한 한글은 고금을 통해 우리말을 표기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훌륭한 글자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p></td></tr></tbody></table><br></div></div></div>
<!-- -->
카페 게시글
지명유래연구방
토박이 이름의 한자식 표기 - 배우리
소석
추천 0
조회 643
17.04.04 05:18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