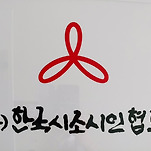<p><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태백, 겨울 탄광촌 <span data-ke-size="size18">외 2편</span></span></p><p>&#160;</p><p><b><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oto Serif KR';">김효신</span></b></p><p>&#160;</p><p>&#160;</p><p><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oto Serif KR';">갱도 밑 수백 미터 탄을 캐던 아버지 </span></p><p><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oto Serif KR';">검은 물 검은 산맥 유년기 탄광촌에 </span></p><p><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oto Serif KR';">맑은 물 청정한 바람 상상이나 했을까 </span></p><p>&#160;</p><p><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oto Serif KR';">검은 꿈 흐르던 강 산천어 찾아들고 </span></p><p><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oto Serif KR';">가난을 벗어나서 산소 도시 이루었네 </span></p><p><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oto Serif KR';">판잣집 허름했던 터엔 하늘 높은 아파트 </span></p><p>&#160;</p><p><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oto Serif KR';">식목한 자작나무 잔설 위에 윤이 나는 </span></p><p><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oto Serif KR';">함백산 높은 고개 내 탯줄 묻힌 곳 </span></p><p><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oto Serif KR';">아버지 가난을 끊고 바람 되어 계시네</span></p><p>&#160;</p><p>&#160;</p><p>&#160;</p><p><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까치집 단상</span></p><p>&#160;</p><p>&#160;</p><p><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oto Serif KR';">높다란 전봇대에 무허가 초옥 한 채 </span></p><p><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oto Serif KR';">부수고 헐어내도 또 짓는 굳은 근성 </span></p><p><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oto Serif KR';">물어 온 잔가지에 쇠토막 정교하게 지었네. </span></p><p>&#160;</p><p><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oto Serif KR';">임자 없는 허공 땅 먼저 살면 점유자 </span></p><p><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oto Serif KR';">임대인과 임차인 계약도 필요 없고 </span></p><p><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oto Serif KR';">전망도 일조권도 좋아 로열층이 따로 없네. </span></p><p>&#160;</p><p><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oto Serif KR';">눈뜨면 땅값 뛰고 다락같이 뛰는 셋집 </span></p><p><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oto Serif KR';">반려조 동거 조건 어려운 집 구하기 </span></p><p><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oto Serif KR';">잠시만 살다 가는 곳 까치집이 부럽네.</span></p><p>&#160;</p><p>&#160;</p><p>&#160;</p><p><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출근길</span></p><p>&#160;</p><p>&#160;</p><p><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oto Serif KR';">그때는 몇 날 며칠 쉼없이 폭설 내려 </span></p><p><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oto Serif KR';">새벽녘 끊어진 길 쌓인 눈 쓸며 갔지 </span></p><p><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oto Serif KR';">내 나이 그때 어머니 나이, 소리 없는 출근길 </span></p><p>&#160;</p><p><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oto Serif KR';">수마가 헤집고 간 장마철 좁은 골목 </span></p><p><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oto Serif KR';">맨발로 길 터가며 달음박질하던 날 </span></p><p><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oto Serif KR';">공화교 검은 냇물은 어머니의 애간장 </span></p><p>&#160;</p><p><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oto Serif KR';">육남매 잠든 모습 희망이라 여기며 </span></p><p><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oto Serif KR';">불혹의 곱던 청춘 물집 잡힌 굳은살</span></p><p><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oto Serif KR';"> 어머니, 세 글자 마디마디 굳은살로 아픕니다</span></p><p>&#160;</p><p>&#160;</p><p><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당 / 선 / 소 / 감 </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8"><b><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oto Serif KR';">예사로 들리지 않는 작은 소리의 기쁨</span></b></span></p><p>&#160;</p><p><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oto Serif KR';">&#160; 평범하고 소소한 저의 글을 시인의 마음으로 읽어주시고 채택해 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백이운 선생님과 화윤 선차회 박남식 선생님께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span></p><p><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oto Serif KR';">&#160; 20년 전 차 공부를 시작하면서 쓰기 시작한 ‘차 일기’가 오늘의 저를 있게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배추 전을 부치다가 지글거리는 기름 소리가 비 오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누구에겐가 인정을 받고 시인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작은 소리 하나도 예사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 기뻤습니다. </span></p><p><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Noto Serif KR';">&#160; 아직은 많이 미력하지만 글에 속지 않고, 진정으로 소통하고 공감 하는 글을 쓰겠습니다.</span></p>
<!-- -->
카페 게시글
신인상
신인상 - 김효신 시인 (2023. 봄호)
시조미학
추천 0
조회 33
23.04.03 15:13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