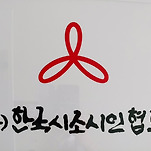<p>2. 신라고적10경 10수 (2017. 6. 16) 속명승보 2</p><p><span data-ke-size="size14">제</span><span data-ke-size="size14">1</span><span data-ke-size="size14">경 석굴암</span></p><p><span data-ke-size="size14">제</span><span data-ke-size="size14">2</span><span data-ke-size="size14">경 불국사</span></p><p><span data-ke-size="size14">제</span><span data-ke-size="size14">3</span><span data-ke-size="size14">경 다보탑</span></p><p><span data-ke-size="size14">제</span><span data-ke-size="size14">4</span><span data-ke-size="size14">경 첨성대</span></p><p><span data-ke-size="size14">제</span><span data-ke-size="size14">5</span><span data-ke-size="size14">경 안압지</span></p><p><span data-ke-size="size14">제</span><span data-ke-size="size14">6</span><span data-ke-size="size14">경 포석정</span></p><p><span data-ke-size="size14">제</span><span data-ke-size="size14">7</span><span data-ke-size="size14">경 계림</span></p><p><span data-ke-size="size14">제</span><span data-ke-size="size14">8</span><span data-ke-size="size14">경 무열왕릉</span></p><p><span data-ke-size="size14">제</span><span data-ke-size="size14">9</span><span data-ke-size="size14">경 황룡사지</span></p><p><span data-ke-size="size14">제</span><span data-ke-size="size14">10</span><span data-ke-size="size14">경 분황사</span></p><p>&#160;</p><p><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고도 경주</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서라벌</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동경</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월성</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에 남은 신라유적 중</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비교적 인지도와 역사성이 높은 경관 </span><span data-ke-size="size14">10</span><span data-ke-size="size14">개를 필자가 임의로 골랐다</span><span data-ke-size="size14">.</span></p><p>&#160;</p><p>제1경. 석굴암(石窟庵)</p><p>동해를 응시하랴 묵상에 빠진 부처</p><p>속눈썹 끔벅하면 반안(半眼) 마저 열릴 터</p><p>연좌(蓮座) 위 근엄한 수인(手印) 사바 마귀 짓눌러</p><p>&#160;</p><p><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경북 경주시 토함산 중턱에 있는 국보 제</span><span data-ke-size="size14">24</span><span data-ke-size="size14">호다</span><span data-ke-size="size14">. 1995</span><span data-ke-size="size14">년 불국사와 함께</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span><span data-ke-size="size14">.</span></p><p><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졸저 </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名勝譜</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대한</span><span data-ke-size="size14">8</span><span data-ke-size="size14">경 중</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제</span><span data-ke-size="size14">2</span><span data-ke-size="size14">경 </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석굴암의 아침 풍경</span><span data-ke-size="size14">’(9</span><span data-ke-size="size14">면</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시조 참조</span><span data-ke-size="size14">. 2017. 7. 7 </span><span data-ke-size="size14">도서출판 수서원</span><span data-ke-size="size14">.</span></p><p>&#160;</p><p>제2경. 불국사(佛國寺)</p><p>연두 빛 불국 정토 업(業) 울린 범종소리</p><p>소쩍새 독경하다 살며시 눈물짓나</p><p>노송(老松)은 지팡이 집고 구름다리 건너오</p><p>&#160;</p><p><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토함산에 있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경내 면적은 </span><span data-ke-size="size14">38</span><span data-ke-size="size14">만 </span><span data-ke-size="size14">8,570</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이며</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사적 및 명승 제</span><span data-ke-size="size14">1</span><span data-ke-size="size14">호로 지정되었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국보급을 비롯한 수많은 문화재가 보존되어 있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재론이 필요 없는 대단히 아름다운 절로</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두 개의 멋진 다리가 있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아래쪽 </span><span data-ke-size="size14">18</span><span data-ke-size="size14">계단이 청운교</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靑雲橋</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위쪽 </span><span data-ke-size="size14">16</span><span data-ke-size="size14">계단이 백운교</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白雲橋</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솔숲도 근사하다</span><span data-ke-size="size14">.</span></p><p>&#160;</p><p>제3경. 다보탑(多寶塔)</p><p>화강암 깎고 잘라 성냥개비 놀이하듯</p><p>절묘한 사각불탑 다보여래(多寶如來) 현신(現身)일까</p><p>비구니 탑돌이 할 제 천년 때도 영롱타</p><p>&#160;</p><p><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불국사에 있으며</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국보 제</span><span data-ke-size="size14">20</span><span data-ke-size="size14">호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대웅전과 자하문 사이의 뜰 동서 두 개의 탑 중</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동쪽에 있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서쪽의 석가탑</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국보 제</span><span data-ke-size="size14">21</span><span data-ke-size="size14">호</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과 쌍벽을 이룬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화강암으로 만든 이 탑은 조형성과 예술성을 모두 갖춘 통일신라 석조미술의 백미로 평가받고 있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또한 석가여래와</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다보여래의 만남을 현실공간에서 탑으로 주선했고</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소위 불교경전에서 말하는 탑의 모습을 독창적인 시각에서 표현했다는 점에서</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큰 의의를 지닌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우리 </span><span data-ke-size="size14">10</span><span data-ke-size="size14">원 짜리 동전에도 잘 새겨져 있어</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시적으로 자주 인용된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유안진의 시 </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다보탑을 줍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고개 떨구고 가다가 다보탑</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多寶塔</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을 주웠다</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국보 </span><span data-ke-size="size14">20</span><span data-ke-size="size14">호를 줍는 횡재를 했다</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중략</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쓸모 있는 듯 별 쓸모없는 </span><span data-ke-size="size14">10</span><span data-ke-size="size14">원짜리</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그렇게 살아왔다는가 그렇게 살아가라는가</span></p><p><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다보여래</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동방의 보정세계</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寶淨世界</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에 있다는 부처</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석가모니가 영취산에서 </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법화경</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을 설법할 때</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땅속에서 다보탑과 함께 솟아 소리를 질러 석가모니의 설법이 </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참</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이라고 증명하였다고 한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다보라 함</span><span data-ke-size="size14">.</span></p><p>&#160;</p><p>제4경. 첨성대(瞻星臺)</p><p>하늘은 이십팔수(二十八宿) 땅에는 점성사(占星師)가</p><p>정교히 쌓은 돌탑 두루미 껴안고는</p><p>누워서 중천을 보매 수미산(須彌山)이 반짝여</p><p>&#160;</p><p><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국보 제</span><span data-ke-size="size14">31</span><span data-ke-size="size14">호로</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경주시 인왕동에 있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현재까지 남아 있는 천문대 중</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세계에서 가장 오래 되었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구조는 기단부</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원주부</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정자형두부로 나누어진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화강암으로 총 석재수는 </span><span data-ke-size="size14">365</span><span data-ke-size="size14">개 내외이고</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외벽은 잘 다듬어져 있으나</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내벽은 그렇지 않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쌓은 층은 </span><span data-ke-size="size14">27</span><span data-ke-size="size14">개로 두부를 합쳐 동양 별자리 </span><span data-ke-size="size14">28</span><span data-ke-size="size14">수</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동서남북 각 </span><span data-ke-size="size14">7</span><span data-ke-size="size14">수</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를 상징한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외관은 대체로 술병</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두루미</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을 닮았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이용범</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李龍範</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은 </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천문관측과 관련이 없고</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불교의 우주관인 수미산</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須彌山</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의 모양을 본떠 만든 제단</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이라고 주장한다</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다음 백과</span><span data-ke-size="size14">)</span></p><p>&#160;</p><p>제5경. 안압지(雁鴨池)</p><p>기러기 날아 앉자 유유히 노는 오리</p><p>연못은 진귀한 꽃 아롱진 무산십이봉(巫山十二峰)</p><p>망새여 울지를 마오 옛적 향연 어른대</p><p>&#160;</p><p><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경주시 인왕동에 있는 연못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동국여지승람</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에서는 </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안압지</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라는 이름을 기록하고</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문무왕이 궁궐 안에 못을 파고</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돌을 쌓아 산을 만들었으니</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무산십이봉</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巫山十二峰</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을 본떴으며</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이하 략</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라고 하여</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그 조성이 신선사상과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멋진 기와 망새</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망와</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바래기와</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望斯</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가 출토되었다</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단정한 건물 임해전</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臨海殿</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사적 제</span><span data-ke-size="size14">18</span><span data-ke-size="size14">호</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은 궁중연회장으로 쓰였다</span><span data-ke-size="size14">.</span></p><p><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무산십이봉</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중국 사천성 장강 삼협 무협</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巫峽</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에 있는 빼어난 </span><span data-ke-size="size14">12</span><span data-ke-size="size14">봉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가장 유명한 것은 신녀봉</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神女峰</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옥황상제의 </span><span data-ke-size="size14">23</span><span data-ke-size="size14">번째 딸인 선녀 요희가 양자강에 내려와 백성들을 위해 강을 다스리다가</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이 바위로 변했다는 전설이 있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초나라 양왕</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혹은 회왕</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은 신녀를 만나기 위해 이곳을 찾아왔지만</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구름과 안개 때문에 결국 보지 못하고</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꿈에서만 사모했다고 한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이를 가리켜 운우지정</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雲雨之情</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이라 한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p><p>&#160;</p><p>제6경. 포석정(鮑石亭)</p><p>술 한잔 시 한수로 한시름 잊으랴만</p><p>시냇물 끌어들여 돌전복도 맛봤을까</p><p>나라는 망할지언정 유상곡수(流觴曲水) 질펀해</p><p>&#160;</p><p><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경주시 배동</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경주 남산의 서쪽에 있으며</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연회장소로 자주 이용되었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시냇물을 끌어들여 포어를 본떠 만든 석구</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石溝</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로</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사적 제</span><span data-ke-size="size14">1</span><span data-ke-size="size14">호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삼국유사</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권</span><span data-ke-size="size14">2 ‘</span><span data-ke-size="size14">처용랑망해사조</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에 헌강왕</span><span data-ke-size="size14">(875~885)</span><span data-ke-size="size14">이 포석정에 행차했을 때</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남산신이 나타났다고 기록된 걸로 봐</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통일신라시대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한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이곳은 </span><span data-ke-size="size14">927</span><span data-ke-size="size14">년 경애왕이 왕비</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궁녀</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신하들과 놀다가</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견훤의 습격을 받아 죽은 곳이기도 하다</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다음 백과</span><span data-ke-size="size14">)</span></p><p><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포어</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鮑魚</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절인 생선 또는</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전복</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全鰒</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조개를 뜻한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포석정은 마른 굴비를 약간 닮았다</span><span data-ke-size="size14">.</span></p><p><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유상곡수</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정원에서 술잔을 띄우고 자기 앞으로 떠내려 올 때까지 시를 읊던 연회로</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동양의 선비나 귀족들이 즐겼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곡수유상</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曲水流觴</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곡수지유</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曲水之遊</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곡수연</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曲水宴</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곡강연</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曲江宴</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이라고도 한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이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알려진 것은 </span><span data-ke-size="size14">4</span><span data-ke-size="size14">세기경에 쓰인 왕희지의 난정서</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蘭亭序</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로</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문인들을 모아 굽이진 물줄기에 줄서 앉아 시를 지으며 즐겼다는 내용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이러한 문화는 한국과 일본에도 전파되었는데</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한국의 포석정은 현존하는 유상곡수 유적으로는 한중일 삼국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위키백과</span><span data-ke-size="size14">)</span></p><p><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일상일영</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日觴一詠</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한잔 술에</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시 한수를 읊음</span><span data-ke-size="size14">.</span></p><p>&#160;</p><p>제7경. 계림(鷄林)</p><p>닭 우는 신목(神木)에는 금궤가 걸렸으니</p><p>계림국 푸른 새벌 숲 향기 상큼한데</p><p>버섯 핀 남빛 기왓장 세월 좀이 슬었소</p><p>&#160;</p><p><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경주시 교동에 있는 경주 김씨 시조</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김알지</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의 발상지로</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사적 제</span><span data-ke-size="size14">19</span><span data-ke-size="size14">호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원래 시림</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始林</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이라 하여</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신라 초부터 있었던 숲으로 경역</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境域</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은 약 </span><span data-ke-size="size14">7,300</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이며</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느티나무</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물푸레나무</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싸리나무 등의 고목이 무성하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경내 사당이 고풍스럽다</span><span data-ke-size="size14">. &lt;</span><span data-ke-size="size14">삼국유사</span><span data-ke-size="size14">&gt; </span><span data-ke-size="size14">신라 시조 혁거세왕조</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條</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에 보면</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왕은 계정에서 태어났고</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왕비 알영은 계룡에게서 태어난 까닭에</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계림국이라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그러나 계림의 계</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鷄</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를 </span><span data-ke-size="size14">&#39;</span><span data-ke-size="size14">새</span><span data-ke-size="size14">&#39;</span><span data-ke-size="size14">로 읽어</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계림은 </span><span data-ke-size="size14">&#39;</span><span data-ke-size="size14">새벌</span><span data-ke-size="size14">&#39;</span><span data-ke-size="size14">의 다른 표기에 불과하다는 설이 유력하다</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다음 백과</span><span data-ke-size="size14">)</span></p><p>&#160;</p><p>제8경. 무열왕릉(武烈王陵)</p><p>고분(古墳)은 웅장하고 잔디도 무성하랴</p><p>둘레돌에 앉은 황새 행진곡 들려줘도</p><p>명군이 오열(嗚咽)하시다 사분오열 산하여</p><p>&#160;</p><p><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경주시 서악동에 있는 신라 제</span><span data-ke-size="size14">29</span><span data-ke-size="size14">대 태종 무열왕의 능으로 사적 제</span><span data-ke-size="size14">20</span><span data-ke-size="size14">호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높이 약</span><span data-ke-size="size14">13m, </span><span data-ke-size="size14">주위 둘레 약</span><span data-ke-size="size14">112m. </span><span data-ke-size="size14">서악동 구릉 동쪽 사면에 일렬로 배치되어 있는 </span><span data-ke-size="size14">5</span><span data-ke-size="size14">기의 원형분 중</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가장 아래쪽에 위치해 있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봉분 주위는 큰 자연석으로 된 둘레돌을 세워놓았는데</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현재 일부만 노출되어 있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능의 전방 좌측에 귀부와 이수가 남아 있어 신라의 역대 왕릉 가운데</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피장자가 명확한 유일한 능으로 꼽힌다</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다음 백과</span><span data-ke-size="size14">)</span></p><p><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지금 조국은 남북한</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게다가</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영남</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호남</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보수</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진보 등으로</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산산이 찢어져 있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지금도 </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南男北女</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는 유효하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옛날 영남은 </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學文</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으로</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호남은 </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文學</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으로 서로 장기를 앞세우곤 했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p><p><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라데츠키 행진곡</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요한 슈트라우스 </span><span data-ke-size="size14">1</span><span data-ke-size="size14">세가 작곡하여 요제프 라데츠키에게 헌정한 곡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힘차게 전진하는 행진곡 풍의 리듬에</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반복되는 멜로디가 인상적인 곡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경쾌하면서도 박력 있는 진행 덕분으로 세계 각국의 여러 행사에서 자주 연주되며</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피날레를 장식하기도 한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p><p><span data-ke-size="size14">* 2018. 2. 18 </span><span data-ke-size="size14">시조 종장 앞 구 수정</span><span data-ke-size="size14">.</span></p><p>&#160;</p><p>제9경. 황룡사지(皇龍寺址)</p><p>대가람 자취 없어 초승이 흘긴 주초</p><p>삼보(三寶)는 불에 타고 무영탑(無影塔)만 하늘거려</p><p>황룡이 재현한다면 만파식적(萬波息笛) 불겠지</p><p>&#160;</p><p><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경주시 구황동에 있는 사적 제</span><span data-ke-size="size14">6</span><span data-ke-size="size14">호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삼국시대 가장 큰 절로 대표적 왕실사찰이었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신라</span><span data-ke-size="size14">3</span><span data-ke-size="size14">보인 장륙존상과</span><span data-ke-size="size14">, 9</span><span data-ke-size="size14">층목탑이 있었던 곳으로도 유명하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나머지 하나는 진평왕의 옥대</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玉帶</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삼국사기</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와 </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삼국유사</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에 </span><span data-ke-size="size14">553</span><span data-ke-size="size14">년</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진흥왕 </span><span data-ke-size="size14">14) </span><span data-ke-size="size14">월성</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月城</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동쪽에 새로운 궁궐을 지으려고 할 때</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황룡이 나타나자 그곳에다 황룡사라는 절을 짓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다</span><span data-ke-size="size14">. 584</span><span data-ke-size="size14">년</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진평왕 </span><span data-ke-size="size14">6)</span><span data-ke-size="size14">에는 금당을 건립해 몇 차례 중건되면서</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고려시대까지 국가왕실의 보호 아래 호국사찰로 숭앙되었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다음 백과</span><span data-ke-size="size14">)</span></p><p><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만파식적</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신라시대 전설상의 피리로</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원명은 만만파파식적</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萬萬波波息笛</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제</span><span data-ke-size="size14">31</span><span data-ke-size="size14">대 신문왕이 아버지 문무왕을 위해</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감은사</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感恩寺</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를 지은 후에</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해룡이 된 문무왕과</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천신</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天神</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이 된 김유신</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金庾信</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으로부터 대나무를 얻어 만든 피리라 한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이를 불면 적군이 물러가고</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병이 나으며</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가뭄이 들면 비가 오고</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장마 때는 비가 개며</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바람이 불 때는 그치고</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물결이 평온해졌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그리하여 이름을 </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만파식적</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이라 하고</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역대 임금들이 보배로 삼았다고 전한다</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문화콘텐츠 용어사전</span><span data-ke-size="size14">)</span></p><p>&#160;</p><p>제10경. 분황사(芬皇寺)</p><p>면면히 이은 법등 정묘(精妙)한 모전석탑(模塼石塔)</p><p>돌우물 감로수라 거위도 맘보춤을</p><p>살 깨진 수막새 입술 신라 미소 잔잔해</p><p>&#160;</p><p><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경주시 분황로 </span><span data-ke-size="size14">94-11 (</span><span data-ke-size="size14">구황동</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대한불교조계종 제</span><span data-ke-size="size14">11</span><span data-ke-size="size14">교구 본사 불국사의 말사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이 절은 황룡사지와 잇닿아 있으면서</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모전석탑</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으로 유명하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선덕여왕 </span><span data-ke-size="size14">3</span><span data-ke-size="size14">년</span><span data-ke-size="size14">(634)</span><span data-ke-size="size14">에 건립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우리 민족이 낳은 위대한 고승 원효와</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자장이 거쳐 간 사찰로 명성이 높다</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다음 백과</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p><p><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모전석탑</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국보 제 </span><span data-ke-size="size14">30</span><span data-ke-size="size14">호로</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높이 </span><span data-ke-size="size14">930cm</span><span data-ke-size="size14">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분황사 창건 당시에 세워진 것으로</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바다 속의 안산암을 벽돌모양</span>으로 <span data-ke-size="size14">다듬어 쌓은 탑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원래는 </span><span data-ke-size="size14">9</span><span data-ke-size="size14">층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나</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현재는 </span><span data-ke-size="size14">3</span><span data-ke-size="size14">층뿐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단층의 기단은 자연석으로 높게 쌓았으며</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그 위에 화강암 받침을 마련하고</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탑신을 쌓았다</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대한민국 구석구석</span><span data-ke-size="size14">)</span></p><p><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석정</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石井</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돌우물</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당시의 우물 팔각석정에는 아직도 물이 마르지 않고 있는데</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이 우물 속에 호국용이 살았다는 전설이 있다</span><span data-ke-size="size14">. 1965</span><span data-ke-size="size14">년 우물에서 </span><span data-ke-size="size14">14</span><span data-ke-size="size14">구의 목이 부러진 석불이 출토되었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학명은 삼룡변어정</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三龍變魚井</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4">.</span></p><p><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신라 수막새</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국립경주박물관에 전시된 </span><span data-ke-size="size14">&#39;</span><span data-ke-size="size14">신라인의 미소</span><span data-ke-size="size14">&#39;</span><span data-ke-size="size14">를 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반한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두터운 얼음장마저 녹일 듯 따스한 미소를 띠면서도</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꼭 다문 입이 오뚝한 콧날과 함께</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외유내강한 신라여인의 모습을 잘 표현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백과사전</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신라 때 만든 것이 아니라</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일제 시절 다른 지방에서 재현했다는 설도 있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p><p><span data-ke-size="size14">------------</span></p><p><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도봉문학</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제</span><span data-ke-size="size14">15</span><span data-ke-size="size14">호</span><span data-ke-size="size14">(2017</span><span data-ke-size="size14">년</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명승보 </span><span data-ke-size="size14">2. </span><span data-ke-size="size14">시조 </span><span data-ke-size="size14">2</span><span data-ke-size="size14">수</span><span data-ke-size="size14">.</span></p><p><span data-ke-size="size14">* 2017</span><span data-ke-size="size14">년 </span><span data-ke-size="size14">11</span><span data-ke-size="size14">월에 발생한 경주</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포항 일대의 지진으로 귀중한 유산이 손상될까 걱정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4">.</span></p><p><span data-ke-size="size14">* 졸저 「鶴鳴」&#160;정격 단시조집(8) 산려소요 4-2(272~281면). 2019. 6. 20 도서출판 수서원.</span></p><p><span data-ke-size="size14">--------</span></p><p><span data-ke-size="size14">글 쓴 이; 대한민국 등반가.&#160;</span></p><p>&#160;</p><p>&#160;</p>
<!-- -->
카페 게시글
시조의 맛과 멋
학명 산려소요 4-2 신라고적 10경 정격 단시조 10수/반산 한상철
半山 韓相哲
추천 0
조회 445
24.12.28 14:12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