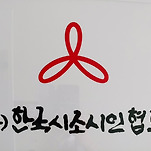<p>5. 변산(邊山)8경 (2017. 5. 15)</p><p>제1경 웅연조대(熊淵釣臺)</p><p>제2경 직소폭포(直沼瀑布)</p><p>제3경 소사모종(蘇寺暮鐘)</p><p>제4경 월명무애(月明霧靄)</p><p>제5경 서해낙조(西海落照)</p><p>제6경 채석범주(採石帆舟)</p><p>제7경 지포신경(止浦神景)</p><p>제8경 개암고적(開巖古蹟)</p><p>&#160;</p><p><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산절승</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해절승인 호남의 </span><span data-ke-size="size14">3</span><span data-ke-size="size14">대명산 변산의 여덟 곳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순서는 인터넷 질문답변 다음카페 </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변산자연생태</span><span data-ke-size="size14">’(2012.7.10)</span><span data-ke-size="size14">를 따랐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출처에 따라 다르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변산은 바깥에다가 산을 세우고</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안을 비운 형국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그래서 해안선을 따라 </span><span data-ke-size="size14">98km</span><span data-ke-size="size14">에 이르는 코스를 </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바깥변산</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이라 부르고</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수많은 사찰과 암자가 있어 한때는 사찰과 암자만을 상대로 여는 중장</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僧場</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이 섰다는</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산의 안쪽을 </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안변산</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으로 부르기도 한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주봉인 의상봉</span><span data-ke-size="size14">(508m), </span><span data-ke-size="size14">주류산성</span><span data-ke-size="size14">(331m), </span><span data-ke-size="size14">남옥녀봉</span><span data-ke-size="size14">(432.7m), </span><span data-ke-size="size14">옥락봉</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세봉</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관음봉</span><span data-ke-size="size14">(424m), </span><span data-ke-size="size14">신선대</span><span data-ke-size="size14">(486m), </span><span data-ke-size="size14">망포대</span><span data-ke-size="size14">(492m), </span><span data-ke-size="size14">쌍선봉</span><span data-ke-size="size14">(459m) </span><span data-ke-size="size14">등의 산들이 안변산을 에워싼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그 안에 백천내의 물이 부안 댐에 갇혀 고창ㆍ부안 사람들의 식수원이 되고</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남은 물은 해창</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海昌</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에서 서해로 흘러 보낸다</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다음카페 홀대모</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p><p><span data-ke-size="size14">부안은 십승지</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十勝地</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중 하나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직소폭포</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기생 이매창</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李梅窓 </span><span data-ke-size="size14">1573~1610), </span><span data-ke-size="size14">지포</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止浦</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김구</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金坵 </span><span data-ke-size="size14">1211~1278)</span><span data-ke-size="size14">를 부안삼절</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扶安三絶</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이라 일컫는다</span><span data-ke-size="size14">.</span></p><p>&#160;</p><p>제1경. 웅연조대(熊淵釣臺)</p><p>곰소항 어선 행렬 바다는 청량가(淸凉歌)를</p><p>낚싯대 둘러메고 휘파람 부는 조사(釣士)</p><p>갯바람 짭짤하거다 물에 어린 야등(夜燈) 빛</p><p>&#160;</p><p><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줄포</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茁浦</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에서 시작하여 곰소 앞바다를 지나는 아름다운 경치</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서해 앞바다에 펼쳐지는 어선들의 행진과</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밝혀놓은 야등이 물에 어리는 모습</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강촌의 어부들이 낚싯대를 둘러메고 청량가</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淸&#28092;歌</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를 부르는 경치를 함께 일컫는다</span><span data-ke-size="size14">.</span></p><p>&#160;</p><p>제2경. 직소폭포(直沼瀑布)</p><p>안변산 흑진주지 일백 자 하얀 폭포</p><p>청룡이 혀 내민 듯 내리꽂는 은하수</p><p>우레는 천지 흔들고 궁둥방아 찐 용추</p><p>&#160;</p><p><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안변산의 가장 중심지에 있는 직소폭포는 변산반도의 백미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직소폭포와 봉래구곡</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蓬萊九曲</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중계계곡</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의 선경을 보지 않고는 </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변산</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을 말할 수 없다는 세평이 있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높이 </span><span data-ke-size="size14">30m</span><span data-ke-size="size14">로</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국립공원 내에 자리 잡고 있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남서부 산악지대인 선인봉</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仙人峰</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동남쪽 기슭에 직소천의 지류들이 계곡을 따라 흐른 계류폭포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웅장한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폭포 아래</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둥근 소는 실상용추</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實相龍湫</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라 한다</span>.</p><p><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졸저 </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한국산악시조대전</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부제 산음가 </span><span data-ke-size="size14">山詠 </span><span data-ke-size="size14">1-244(208</span><span data-ke-size="size14">면</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변산 추락</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변산 쌍선봉 시조 참조</span><span data-ke-size="size14">. 2018. 6. 25 </span><span data-ke-size="size14">도서출판 수서원</span><span data-ke-size="size14">.</span></p><p>&#160;</p><p>제3경. 소사모종(蘇寺暮鐘)</p><p>가인은 샐쭉하고 향 짙은 전나무숲</p><p>대웅전 꽃 문살에 천년 침묵 흐르건만</p><p>내소사 저녁 종소리 온 변산을 울리네</p><p>&#160;</p><p><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가인봉</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佳人峰</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일명 </span><span data-ke-size="size14">觀音峰 </span><span data-ke-size="size14">424m)</span><span data-ke-size="size14">을 배경으로 하고</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아름드리 전나무가 빽빽이 들어차 있는 천년 내소사</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來蘇寺</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의 경치와 어울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곰소만 푸른 바다의 정경과 어둠을 헤치고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저녁 종소리는 참 신비롭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단청을 하지 않은 대웅전 꽃 문살이 수수한 미</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美</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를 간직하고 있다</span><span data-ke-size="size14">.</span></p><p>&#160;</p><p>제4경. 월명무애(月明霧靄)</p><p>월명암(月明庵) 비춘 만월 서해로 기우는데</p><p>일출(日出) 전 지저귄 새 연인 단잠 깨우고</p><p>자욱한 새벽안개 위 빠끔 내민 산봉들</p><p>&#160;</p><p><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월명암 법당 앞마당에서 둥실 떠오르는 밝은 달도 일품이거니와</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해뜨기 전 들려오는 온갖 산새소리와 어울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자욱한 안개를 뚫고 하나 둘씩 솟아나는 산봉우리들의 자태가 가히 절경을 빚는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저녁노을도 아름답다</span><span data-ke-size="size14">.</span></p><p>&#160;</p><p>제5경. 서해낙조(西海落照)</p><p>한 눈에 잡힌 황해 뭇 섬은 올망졸망</p><p>노을이 비껴 앉자 수평선 화염(火焰) 일어</p><p>큰 바위 항마좌 튼 채 오물거린 일진언(一眞言)</p><p>&#160;</p><p><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서해의 일락은 모두 아름답지만</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월명암 옆 낙조대는 특히 조망이 뛰어나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이곳에서 고군산열도</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古群山列島</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와 위도</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蝟島</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의 섬들을 지긋이 바라보라</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해지기 직전 더욱 황홀하게 빛을 내며 바다를 물들이는 석양의 장관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서해안 </span><span data-ke-size="size14">3</span><span data-ke-size="size14">대 일몰감상지로</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흔히 동해안의 낙산 일출과 대비된다</span><span data-ke-size="size14">.</span></p><p><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항마좌</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降魔坐</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결가부좌</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結跏趺坐</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의 일종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먼저 오른발을 왼쪽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왼발을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려놓아</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두 발바닥이 모두 위로 향하게 하며</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손도 오른손을 밑에 두고</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왼손을 위에 올려놓는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이는 천태종이나 선종과 같은 현교</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顯敎</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에서 많이 사용한다</span><span data-ke-size="size14">.</span></p><p><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진언은 원래 해석을 하지 않는다</span><span data-ke-size="size14">!</span></p><p>&#160;</p><p>제6경. 채석범주(採石帆舟)</p><p>시책(詩冊)에 쌓인 더께 해벽(海壁)결 오밀조밀</p><p>배회한 소객(騷客)이여 돛단배 묶어놓고</p><p>찰랑댄 채석강 위서 회 한 접시 맛보오</p><p>&#160;</p><p><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억겁의 세월을 묵묵히 버틴 바위가 깎이고 씻겨 절벽을 빚고</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이 절벽이 다시 동굴을 이룬 채석강</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採石江</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은 정말 아름답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변산반도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반도 서쪽 끝의 격포항</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格浦港</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오른쪽 닭이봉</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鷄峰</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일대 </span><span data-ke-size="size14">1.5</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의 층암절벽과</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바다를 총칭하는 지명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당의 대시인 이백이 술을 마시며 놀았다는 중국의 채석강</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采石江</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과 흡사해 명명되었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돌의 결과 색이 고와 </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채석</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彩石</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이라 쓰기도 한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바닷가 암반 위 염가</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廉價</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로 파는 회 한 접시와</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소주 한 잔은 참 운치 있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국가명승 제</span><span data-ke-size="size14">13</span><span data-ke-size="size14">호이자</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전라북도기념물 제</span><span data-ke-size="size14">28</span><span data-ke-size="size14">호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4">.</span></p><p>&#160;</p><p>제7경. 지포신경(止浦神景)</p><p>성긴 듯 찍힌 군도(群島) 지포길 아기자기</p><p>산등성 통쾌 해풍 겨드랑이 씻어주고</p><p>쓸려온 조개껍데기 손녀 발을 간질여</p><p>&#160;</p><p><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예전에는 변산면 지서리를 지지포</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止止浦</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라고 불렀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지서리에서 쌍선봉</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雙仙峰</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으로 향하는 다소 가파른 등성이를 올라 산중턱에 오르면</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시원한 바닷바람이 가슴을 씻는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봉우리들 사이로 서해가 그림처럼 눈앞에 펼쳐진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최근에 경관과 구역별 특성에 맞게 마실길을 잘 조성했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솔숲이 있는 지지포 해수욕장도 피서지로 괜찮다</span><span data-ke-size="size14">.</span></p><p>&#160;</p><p>제8경. 개암고적(開巖古蹟)</p><p>잔잔한 개암호수 비오리 물길 내면</p><p>우금암((遇金岩) 동백 잎엔 애첩인양 눈 내려도</p><p>문살 위 쌍도깨비가 느닷없이 눈 찔러</p><p>&#160;</p><p><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변산 </span><span data-ke-size="size14">4</span><span data-ke-size="size14">대 명찰 중 하나인 개암사 유적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이 절은 나라를 빼앗긴 백제 유군</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遊軍</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이 진을 치고 백제 부흥운동을 전개한 본거지라</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역사와 고적의 향취를 물씬 풍긴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사철 다 좋지만</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설경이 특히 아름답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대웅보전 문살 도리 위 쌍도깨비의 툭 불거져 나온 눈이 무척 인상적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p><p><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비오리</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국내에서는 흔한 겨울철새이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최근 동강을 비롯한 강원 일부 산간계곡에서 번식이 확인되고 있다</span><span data-ke-size="size14">. 10</span><span data-ke-size="size14">월 중순에 도래하며</span><span data-ke-size="size14">, 4</span><span data-ke-size="size14">월 중순까지 관찰된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내륙의 호수</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댐 등지에서 무리를 이루어 생활한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일부 개체는 바다와 만나는 강</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하천에서도 서식한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날카로운 긴 부리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일정한 대형을 이루어</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무리의 앞에서부터 차례로 잠수해 먹이 사냥한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월동 중에는 시끄럽지 않고</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별다른 소리를 내지 않는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p><p><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우금암</span><span data-ke-size="size14">(</span>遇金岩)<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나당연합군이 승전 후</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당나라 소정방과 김유신 장군이 만난 바위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족히 </span><span data-ke-size="size14">200</span><span data-ke-size="size14">여명이 주둔할 수 있는 복신</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福信</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굴이 있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내분이 생겨 승</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僧</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도침</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道琛</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을 죽인</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복신장군이 병을 핑계 삼아</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왜에 가 있던 풍왕</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豊王</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이 병문안을 오면 치려고 했는데</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풍왕이 먼저 알고</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자객을 보내 복신장군을 앞서 죽이고 만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백제의 한이 서린 유서 깊은 우금산성이 있다</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새만금일보 </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개암고적과 우금암</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송기옥 칼럼</span><span data-ke-size="size14">(2013.12.13)</span><span data-ke-size="size14">을 참고</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끝</span><span data-ke-size="size14">.</span></p><p><span data-ke-size="size14">---------</span></p><p><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山書</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제</span><span data-ke-size="size14">28</span><span data-ke-size="size14">호</span><span data-ke-size="size14">(2017</span><span data-ke-size="size14">년도</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풍치시조 </span><span data-ke-size="size14">3</span><span data-ke-size="size14">제</span><span data-ke-size="size14">.</span></p><p><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졸저 </span><span data-ke-size="size14">『</span><span data-ke-size="size14">名勝譜</span><span data-ke-size="size14">』 </span><span data-ke-size="size14">&lt;</span><span data-ke-size="size14">한국의 승지 </span><span data-ke-size="size14">266</span><span data-ke-size="size14">곳</span><span data-ke-size="size14">&gt; </span><span data-ke-size="size14">정격 단시조집</span><span data-ke-size="size14">(6) 1-5(44</span><span data-ke-size="size14">면</span><span data-ke-size="size14">). 2017. 7. 7 </span><span data-ke-size="size14">도서출판 수서원</span><span data-ke-size="size14">.</span></p><p>&#160;</p><p>&#160;</p>
<!-- -->
카페 게시글
시조의 맛과 멋
명승보 1-5 변산 8경 정격 단시조/반산 한상철
半山 韓相哲
추천 0
조회 170
25.01.21 16:40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