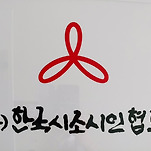<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lt;제24회 고산문학대상 자선 대표작&gt;</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b><span data-ke-size="size20">칼 </span></b><span data-ke-size="size20"><span data-ke-size="size18">외 9편&#160;</span></span></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정수자</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야밤에 칼을 샀네, 비색에 홀려 들어</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오늘의 운세 삼아 입술이나 대볼까</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꿉꿉한 묵언 끌탕이나 채로 진탕 쳐볼까</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직입은 똑 놓치면서 푸념만 후 늘어져도</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대낮에 칼을 품고 나갈 일은 없을지니</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쪼잔히 노염이나 썰어 바람길에 뿌려볼까</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b><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20">나아종*</span></b></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무변의 밤을 긋는 별똥별의 한 획처럼</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벼랑 끝 다다르면 한 홉의 숨을 모아</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사, 랑, 해,</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심장을 건네고 은하로 핀 메아리들……</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6">* 김현승 시, 「눈물」에서.</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b><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20">가을의 밑줄</span></b></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저녁을 일찍 하니 저녁이 길어졌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외등도 조곤조곤 곁을 더 내주고</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접어둔 갈피를 헤듯</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책등들이 술렁였다</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등불과 친해지면 말의 절도 잘 짓는지</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하품 같은 농 끝에도 코가 쑥 빠지지만</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저녁에 길게 들수록</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행간은 더 붐비리</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가을의 질문 같은 동네 책방 창문들도</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길어진 모서리를 모과 모양 밝히고</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누군가 밑줄을 긋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별로 솟곤 하리라</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b><span data-ke-size="size20">윤슬 농현</span></b></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보았는가, 저 꼼질은 틀림없는 물이렷다</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다가서면 스러지는 모래 노래 아니라</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사막 속 윤슬을 켜는 신의 미소 같은 것</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무현<span data-ke-size="size16">無絃</span>의 농현<span data-ke-size="size16">弄絃</span>처럼 사물대는 물비늘들</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가히 홀린 눈썹을 술대 삼는 신기루에</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다저녁 물때를 놓치듯 버스도 지나칠 뻔!</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잡아보려 다가서면 고만큼씩 멀어지던</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시라는 술래 같은 아지랑이 멀미 속에</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줄 없는 거문고 타듯 물의 율을 탐했네</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b><span data-ke-size="size20">사족</span></b><span data-ke-size="size20"><span data-ke-size="size18">蛇足</span></span></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입술을 댈 듯 말 듯 서운히 보낸 어깨</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돌아서고 나서야 없는 너를 만질 때</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귓전에 연해 밟히는 중저음의 느린 여음</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끝동을 길게 두다 서운해진 노을처럼</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말 없는 말 그리며 사족사족 매만지네</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자판에 자그락대는 자모음을 깨물어보듯</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b><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20">소년의 긴 손가락이</span></b></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신전의 부조들을 아다지오로 쓸다 말고</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하늘을 훅 그으니 별들이 쏟아졌다</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나일강 만파를 고르듯</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파피루스 잎을 타듯</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피아노를 타고 놀던 파리한 손가락이</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별 사이를 촉진하자 은파랑이 튀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콤옴보 신화를 토할 듯</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열주들이 울렁였다</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불러 봐 너의 별을, 은파 만파 지휘하듯</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반달 깃든 손톱이 뱃전을 두드릴 때</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누천년 사막 능선 켜온</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달도 뺨을 붉혔다</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b><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20">뭉크는 아니지만</span></b></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노을이 나만 위해 더 붉은 건 아니련만</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뭉친 목 돌리다 지청구를 투둑 맞네</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사는 게 모욕 같아도 뭉개면 또 사는 거라</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절규도 급이 달라 뭉크급은 아니라서</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변명 뭉치 속말이나 일껏 씹어보다</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뜨거운 노을 끝물에 눈꺼풀을 데는 말복</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b><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20">손차양</span></b></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손차양 모르고 산 엄마는 밭이 됐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손차양 달고 산 언니도 서리 노을</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그리다 못내 기다리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기울어간 돌담마냥</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꺼먼 흙 툭툭 떨구던 처마들이 시렸건만</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돌아보면 저녁연기 밥내 솔솔 보내더니</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다 떠난 산자락에는</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타운하우스 차양 천지</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묘도 밀고 들어선 혀 꼬이는 이름 너머</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어디쯤 삭고 있나 노을 적신 휘파람은</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속눈썹 연해 다듬던</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아슴아슴 손차양은</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b><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20">허튼 여백</span></b></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폐가의 펌프 같아</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녹슨 목을 바쳐 봐도</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율<span data-ke-size="size16">律</span>은 안 오고 계절은 훅 가고</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비릿한 귓전 가득히</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파쇄들만 서걱서걱</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가위눌린 천지간에</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눈먼 바람 삭는 소리</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쉰 여운 더듬다 허튼 여백 다듬다</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도무지 울 수도 없어라</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입 여미는 서릿가을</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b><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20">마음을 두고 가서</span></b></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자리를 파했는데 다시 오는 사람 있네</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아무리 뒤져봐도 빠뜨린 게 없다 하니</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아, 실은 마음을 두고 가 되짚었다 고하네</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마음을 두고 가서 멋쩍게 오는 저이는</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어쩌면 나만치나 구멍이 많은 사람</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막 놓친 시구를 찾아 온 길을 뒤적이듯</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아무려나 두고 가서 다시 얻는 심금은</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슴벅대는 눈썹을 일찍이 섬겼다네</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때로는 옛 마음 찾는 허기로도 살리니</span></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160;</p><p style="text-align: left;"><span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 《열린시학》 2024. 가을호</span></span></p>
<!-- -->
카페 게시글
수상작품
제24회 고산문학대상 - 칼 외 9편 / 정수자
김덕남
추천 0
조회 61
24.11.10 05:57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