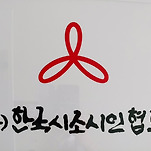<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b><span style="color: #1a5490;">가구가 운다, 나무가 운다&#160;</span></b><span style="color: #1a5490;" data-ke-size="size18">외 5</span></span></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이정환</span></span></p><p>&#160;</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한밤중 한 시간에 한두 번쯤은 족히</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찢어질 듯 가구가 운다, 나무가 문득 운다</span></span></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그 골짝</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찬바람 소리</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그리운 것이다</span></span></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곧게 뿌리내려 물 길어 올리던 날의</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무성한 잎들과 쉼 없이 우짖던 새떼</span></span></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밤마다</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그곳을 향해</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달려가는 것이다</span></span></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일순 뼈를 쪼갤 듯 고요를 찢으며</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명치 끝 밝혀 긴 신음 토하는 나무</span></span></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그 골짝</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잊혀진 물소리</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듣고 있는 것이다</span></span></p><p>&#160;</p><p>&#160;</p><p>&#160;</p><p><b><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span style="color: #1a5490;">애월 바다</span></span></b></p><p>&#160;</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사랑을 아는 바다에 노을이 지고 있다</span></span></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애월, 하고 부르면 명치끝이 저린 저녁</span></span></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노을은 하고 싶은 말들 다 풀어놓고 있다</span></span></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누군가에게 문득 긴 편지를 쓰고 싶다</span></span></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벼랑과 먼 파도와 수평선이 이끌고 온</span></span></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그 말을 다 받아 담은 편지를 전하고 싶다</span></span></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애월은 달빛 가장자리, 사랑을 하는 바다</span></span></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무장 서럽도록 뼈저린 이가 찾아와서</span></span></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물결을 매만지는 일만 그듭하게 하고 있다</span></span></p><p>&#160;</p><p>&#160;</p><p>&#160;</p><p><b><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span style="color: #1a5490;">새와 수면</span></span></b></p><p>&#160;</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강물 위로 새 한 마리 유유히 떠오르자</span></span></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그 아래쪽 허공이 돌연 팽팽해져서</span></span></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물결이 참지 못하고 일제히 퍼덕거린다</span></span></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물속에 숨어 있던 수천의 새떼들이</span></span></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젖은 날갯죽지 툭툭 털며 솟구쳐서</span></span></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한순간 허공을 찢는다, 오오 저 파열음!</span></span></p><p>&#160;</p><p>&#160;</p><p>&#160;</p><p><b><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span style="color: #1a5490;">주상절리</span></span></b></p><p>&#160;</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내 안에 나는 없고 꽃들로 가득했다</span></span></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못물로 출렁였다 노을로 타올랐다</span></span></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맨발로 달려오고 있는 그림자가 붉었다</span></span></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내 목에 어느 날 별빛타래 걸렸다</span></span></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자주구름 걸렸다 새가 사뭇 우짖었다</span></span></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무한정 문이 열렸다 바람 들이닥쳤다</span></span></p><p>&#160;</p><p>&#160;</p><p>&#160;</p><p><b><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span style="color: #1a5490;">시스루</span></span></b></p><p>&#160;</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곧장 내비칠 듯 내비치지 않는 것이</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묘한 느낌으로 벼랑 끝을 달리나니,</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그 깊은 골짜기는 아직 너의 것이 아니다</span></span></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내비칠 듯 내비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찾아들길 바이없는 숲으로 우거져서</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미칠 듯 미치게 하는 실루엣과 같은 것</span></span></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말의 묘미를 좇아 일생을 달려온 이여</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숨 막히는 길 앞에 곧장 기막힐지라도</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끝까지 파고 들지니, 꽃문 열어젖히기까지</span></span></p><p>&#160;</p><p>&#160;</p><p>&#160;</p><p><b><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20"><span style="color: #1a5490;">혀 밑에 도끼</span></span></b></p><p>&#160;</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혀 아래 도끼 들었단 말 들어본 적 있나요?</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남을 자꾸 헐뜯는 사람들의 혓바닥 아래</span></span></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도끼가 숨겨져 있대요, 서슬 푸른 쇠도끼.</span></span></p><p>&#160;</p><p>&#160;</p><p><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1a5490;">- 이정환 시조전집 『서서 천년을 흐를지라도』 2024. 만인사</span></span></p>
<!-- -->
카페 게시글
시조
가구가 운다, 나무가 운다 외 5 / 이정환
김덕남
추천 1
조회 91
24.04.08 06:57
댓글 0
다음검색